▲ 지난달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웃돈을 주고라도 모셔 오고 싶죠.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예 씨가 말랐어요."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A사 임원은 최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엔비디아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 물량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 인프라를 깔아놨지만, 정작 이 장비로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할 '수석 엔지니어급' 인력을 수개월째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A사 임원은 "미국 빅테크 연봉의 70% 수준까지 맞춰주겠다고 제안해도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이미 실리콘밸리로 떠났거나 국내 대기업이 '싹쓸이'해 간 뒤였다"며 "무기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정작 총을 쏠 병사가 없는 형국"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3강'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GPU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를 구동할 핵심 인재가 고갈되는 '풍요 속의 빈곤'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드웨어라는 '그릇'은 커졌는데, 그 안을 채울 '두뇌'는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절대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역설적인 상황인 셈입니다.
학계와 업계의 진단은 냉정합니다.
한국의 AI 하드웨어 경쟁력은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소프트웨어 및 모델링 인력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엔비디아 GPU 26만 장 도입을 확정 짓고 이 중 3만 7천 장을 우선 확보해 연구·교육·데이터센터에 푸는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문제입니다.
글로벌 AI 인재 추적 데이터와 각종 해외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키워낸 고급 AI 인재의 약 40%가 해외 기업이나 연구소에 둥지를 튼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산하 매크로폴로의 조사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가량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 대표적인 'AI 인재 순유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분석에서도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지표는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하위권인 35위에 머물렀습니다.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등 민간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를 배출하지만, 그들이 국내 산업 현장에 남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뼈아프게 반복됩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AI 관련 학과 교수는 "박사 과정 제자 중 소위 'S급'으로 불리는 학생들은 졸업 전부터 미국 빅테크의 러브콜을 받는다"면서 "국내 기업이 제시하는 처우나 연구 자율성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친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GPU와 데이터센터는 늘어나는데, 이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만들 '시니어급 아키텍트'는 씨가 마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유출을 피하고 국내에 남은 한 줌의 인재 풀(pool)을 놓고는 기업 간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은 한정된 파이 안에서 서로의 인재를 빼가는 '회전문 채용'을 반복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이것이 기술의 총량적 발전보다는 비용 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수급 전망은 암울합니다.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인력 부족은 향후 수년간 누적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AI 분야에서만 1만 2천800명, 클라우드 분야에서 1만 8천800명의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9년까지 신기술 분야 중·고급 인재가 약 58만 명이나 부족할 수 있다는 경고등을 켰습니다.
실제 현장의 체감도는 더 심각합니다.
SPRi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7%를 상회하며, 당장 필요한 인력 대비 수천 명에서 1만 명 안팎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국내 AI 인력이 5만 명대 중반까지 늘긴 했지만 낮은 임금 경쟁력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은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웃돈을 주고 옆 동네 사람을 데려오는 '폭탄 돌리기'식 제로섬 싸움"이라며 "주니어급은 AI 대학원이나 부트캠프를 통해 배출되고 있지만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춘 고급 인력은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체 육성'만 고집해서는 가속화되는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AI 선도국들처럼 빗장을 풀고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받아들이는 개방형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주요국은 이미 '인재 블랙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AI·STEM 전공자에게 취업·영주권 패스트트랙, 파격적인 세제 혜택, 연구비 지원 등을 제시하며 전 세계 두뇌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복잡한 비자 절차, 높은 언어 장벽, 열악한 정주 여건 탓에 AI 인재 유치 경쟁에서 사실상 '꼴찌 그룹'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비자 문턱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AI 연구의 허브'로 선택할 만한 확실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득세 감면이나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GPU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해외 인재 유입 전략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외치는 'AI 3대 강국'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I 패권 경쟁에서 1차 대전이 'GPU 확보'였다면, 2차 대전은 '인재 쟁탈전'입니다.
국내 인재를 어떻게 지키고, 해외 인재를 얼마나 과감하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향후 10년 한국 AI의 생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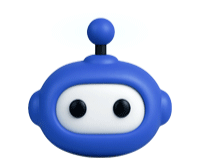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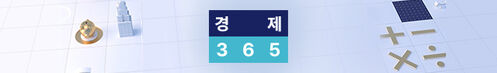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