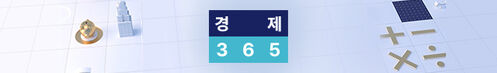<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3일)은 인구 구조 얘기네요.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20대가 630만 2천 명이었고, 70대 이상이 654만 3천 명으로 24만 1천 명 더 많았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70대가 20대를 추월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20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성인 세대 중 가장 적은 세대로 바뀌었고, 그 자리를 50대, 60대, 70대가 채운 겁니다.
작년 인구를 보면 50대가 871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40대, 60대, 70대 이상 순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완전히 '노년 다수, 청년 소수' 구조로 바뀐 거죠.
단순히 인구 비중 변화가 아니라 소비, 세금, 노동 등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소비의 중심이 노년층으로, 아무래도 노년층 비중이 늘어서 그런가 보죠?
<기자>
노년층이 소비의 주력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65세 이상 소비를 보면 243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더 늘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떤지 비교를 해봐야겠죠.
같은 기간 15세에서 64세 노동 연령층 소비는 6.3% 증가에 그쳤습니다.
즉, 노년층의 소비 증가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겁니다.
전체 소비에서 비중도 노년층 비중은 16.7%,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눈에 띄는 건 소비의 성격입니다.
노년층 소비의 절반 이상이 민간 소비 그중에서도 여가, 문화, 외식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즉, 병원비 같은 필수 지출보다는 나를 위한 지출, 즐기는 소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특히 65세에서 74세, 이른바 '젊은 노년층'이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노년층 전체 소비의 59%, 또 자산을 소비로 돌리는 비중의 68%가 이 연령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실제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민간 자산 재배분 규모가 49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저축을 줄이거나 부동산·예금을 처분해서 소비로 돌린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세대를 마케팅 업계에서는 '액티브 시니어', 또는 '뉴 시니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활발히 일하고 배우며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른 '인생 2막 세대'를 뜻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세대 특성이 아니라, 소비의 주도권이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디까지나 노년 인구가 쓰는 돈을 다 합치면 그렇다는 거지,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죠?
<기자>
노년층 소비 통계와 노인 빈곤율 문제가 정반대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얘기입니다.
소비가 늘었다는 건 주로 자산이 있고 건강한 60대에서 70대 초반, '영시니어'층의 변화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고,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만드는 세대죠.
반면 75세 이상 고령층은 소득이 거의 없고, 기초연금에 의존하거나 노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7~40%, OECD 평균인 13%의 세 배 수준으로 여전히 1위입니다.
즉, 같은 '65세 이상' 통계 안에 활발한 소비층과 빈곤층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소비 급증'이 다른 한쪽에서는 '빈곤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건 노년층 내부의 양극화, '돈 쓰는 노인'과 '버티는 노인'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연금 격차, 복지 사각지대,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댓글 아이콘댓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친절한 경제] 20대 추월한 70대 이상…늙어가는 한국](http://img.sbs.co.kr/newimg/news/20251013/202117971_5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