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요 며칠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검찰의 '쿠팡 퇴직금 체불 무혐의 사건' 물밑에는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다. 첫째, '티끌 모아 태산' 재테크 전략이다. 사업체들이 안 준 돈이 한 푼 두 푼 모여 결국 큰돈이 되는 구조. 과거에도, 지금도 반복되는 임금체불의 상징이다. 둘째, 풍문으로만 떠돌던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사법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을 적법으로 둔갑시키는 부적처럼 사법 현장을 떠돌며, '정도껏' 했으면 숨겨졌을 불법을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수호하는 도구로 쓰인다. 셋째, 나이 지긋한 직장인들끼리 "이제는 그렇게 안 하지 않나" 하던 속칭 '조인트 까기', 즉 욕설과 폭언의 문화가 한국 사회 권력의 최중앙에 있는 정부기관에서 여전히 횡행했다는 점이다.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이 억울함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건, 그 총체다.
쿠팡 사건의 큰 줄기는 이렇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인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이 된 것이다.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바꿀 수 없는 법의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퇴직금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보다 불리한 규칙은 무효다. 이를 '최저기준 원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무시될 때 작용하는 관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는 "돈은 안 주고 버티는 게 낫다"는 관성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필자는 종종 사회면의 사기 사건 기사 댓글에서 이러한 관성을 본다. "감방 몇 년 다녀오면 사기친 돈 다 남는다"는 문장은 낯설지 않다. 돈이 '가치를 창조한 노력의 흔적'이 아니라 '징벌의 대가'로 읽힌다. 임금체불 역시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인건비는 제일 마지막에 줘도 된다"는 말은 '달라고 조르면 주고, 안 조르면 안 준다'는 유구한 임금체불의 역사와 함께한다. 법원이나 고용노동부가 지급 명령을 하면 그제야 '징벌이 무서워서' 돈을 준다.
가령 한 프랜차이즈에서는 과거 직원의 근로시간을 15분씩 덜 계산해 주었다(속칭 '꺾기'). 1인당 1주에 약 1시간, 한 달이면 4시간 치 임금을 덜 준 셈이다. 개인에게는 월 4만 원(현재 최저임금 기준)이지만, 직원이 1,000명이라면 매달 4천만 원이 된다. 여기에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의 의뭉스러운 도전 정신이 숨어 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쿠팡 사건처럼 1인당 2백만 원의 임금 체불 신고를 당하더라도(쿠팡 퇴직금 규모가 인당 이 정도였다고 한다) 돌려주면 그 이상의 책임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벌금 몇십만 원이 나올 뿐이다.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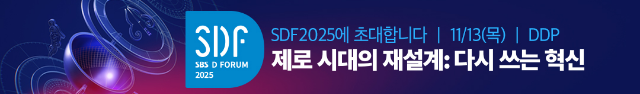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단독] "대한항공 믿었는데" 분통…247명 20시간 '발 동동'](http://img.sbs.co.kr/newimg/news/20251027/202122395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